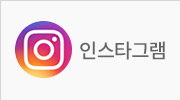[매거진D-리뷰]
최초의 시간 - 김은숙 간사
관련링크
본문
최초의 시간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로 부름받았다
머릿속에서 시계태엽을 뒤 감았던 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렇게 시간을 거슬러 도착한 곳이면 난 꼭 누군가와 함께한다. 언젠가 시공간을 공유했었던, 지금은 멀어져 버린 이들과 함께. 가령 하늘나라에 있는 엄마라든지, 제주도에 있는 오빠라든지, 성주의 풋풋한 청춘들이라든지. 시계태엽을 뒤로 되감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절이 행복했었다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실은 어떤 죄책감, 괴로움, 미안함에 사로잡히는 밤이 더 많았다. ‘좀 더 바라봐 줄걸. 좀 더 귀 기울여 볼걸. 좀 더 살갗을 맞댈 것을.’ 그런 시간의 빈 곳은 갈수록 선명해진다. 짙은 아쉬움과 함께.
짙은 아쉬움은 오롯이 내 몫이고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노릇이다. 진부한 말일 수 있으나 자명한 사실은 시간은 소중하다는 것.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방법이 없기에. 또 현재를 붙잡아 둘 방법도 없을뿐더러, 다가오는 무궁한 시간의 끝은 가늠할 수 없으나 유한한 우리의 끝은 명확하기에 ,시간 안에 갇혀 사는 인간에게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다. 가끔은 눈에 뵈지도 않는 것 따위에 갇혀 산다는 사실이 억울하기도 하지만 말이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경영하라고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창조주는 우리를 또한 시간의 청지기로 부르셨다. 우리는 소중한 시간을 잘 경영할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소중한 것이 그 가치를 보존하느냐 마느냐는 결국 소유주에게 달려 있는 법. ‘소중하다’는 말은 참으로 좋은 말이지만 인간의 탐심을 자극하기에도 딱 좋은 말인데, 과연 우리는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경영해야 할까?
최초의 청지기 아담. 그가 있었던 에덴을 상상해본다. 내가 좋아하는 초록의 세상이 아담을 둘러싸고 있지 않았을까? 엽록소가 충분하여 매우 선명한, 싱그러운 초록의 이파리들이 빨강, 노랑, 색색의 꽃, 열매와 어우러진 동산. 투명한 맑은 물이 흐르고 푸른 하늘과 신선한 땅, 모든 것에 생명체가 충만한 초록의 세상 에덴. 그곳의 아담은 자기만을 위하여 시간을 사용한 것 같지는 않다. 가령 맛있어 보이는 과육들을 모두 맛보느라 정신이 없다든지, 온종일 하늘을 보며 짙은 우수와 감상에 젖어 있는 뭐 그런, 다분히 나의 성향이 투영된 예시이지만 말이다.
죄가 들어오기 전 에덴에서의 아담을 보면 아담은 그저 에덴의 모든 생명들과 시간을 충만히 누렸던 것 같다. 하나님이 이끌어다 준 생명들에 이름을 붙이고 친구가 되어가는, 혼자가 아닌 ‘함께’가 되어가는 시간. 생산적이라든지, 효율이나 성과와는 거리가 꽤 있어 보이는 최초의 청지기 아담의 시간.
시간을 확보하려는, 효율성이 매우 중요한 오늘날의 우리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죄로 물든 세상은 우리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주니, 우리는 살기 위해 생산적으로 땅을 갈고 일을 할 수밖에. 그렇게 시간을 붙잡고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이런 우리 마음의 기저에는 염려, 불안이 떡하니 자리한다. 미래에 대한, 안전에 대한, 안정에 대한, 행복에 대한 염려. 그러나 아직이지만 이미 우리게 임한 하나님나라는 우리에게 말한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마6:26)
보이지 않는 염려, 추측에 의한 불안으로 인하여 우리 눈앞에 자리한 아름다움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담이 그러했던 것처럼 서로의 이름을 짓고 부르는, 그렇게 친구로 엮어져 가는 아름다운 순간들을 눈 뜨고 놓쳐버리는 것은 아닌가?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깨어진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이미 차고 넘치는 불안과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데 가혹한 세상은 더 많은 염려와 더 많은 불안을 우리에게 주입 시킨다. 효율적인 시간 관리, 자기 시간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오늘날, 시간의 청지기인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멈춰 서서 우리의 시간 사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금요일 간사회가 끝나면 제일 먼저 ‘수고하셨습니다.’를 활기차고도 우렁차게 외치고 유유히 사라지는 내가 할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간사회라고 하니 생각나는 일화가 한 가지 있다. 간사모임이 있는 여느 금요일, 담당 캠퍼스 기독연 맡고 계신 사역자 한 분과의 관계로 며칠 골머리를 앓으며 맘고생을 하던 참이었다. 간사 모임에서 나의 어려운 마음을 먼저 말씀드릴 것, 그리고 간사 모임이 끝나면 해당 사역자분께 연락을 드려 나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말씀드릴 것, 이것이 그날의 나의 계획이었다. 해당 사역자분은 지위, 나이, 성별 모든 면에서 나보다 훨씬 힘이 있으신 분이었기에 어려운 마음을 억누르고 소통을 시도한다는 것은 사실 큰 도전이었다.
그날 간사님들은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하셨다. ‘은숙아, 같이 있어 줄게.’ ‘은숙아, 같이 있어 줄까?’ 네 분의 간사님들은 하나같이 먼저 방을 나가지 못하셨다. 간사 모임이 끝나는 금요일 저녁이 얼마나 단 시간인지.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 빈 저녁 시간이기에, 가족들과 함께 하거나 편안한 약속을 잡을 수 있는 그 시간은 언제나 달고 반가운 시간이거늘, 간사님들은 내가 염려되셨는지 정말로 발걸음을 쉬이 떼지 못하셨다. 도리어 ‘이럴 일인가?’ 내가 민망해져 간사님들을 보내드렸고, 사무간사언니만 내 옆에 남았다.
내가 해당 사역자와 소통하는 한 시간 동안 언니는 그냥 내 옆에 있어 줬다. 말 그대로 ‘존재’해줬다. 금요일 저녁을 내 옆에 ‘그냥 있어 주는 것’에 사용하다니. ‘수고하셨습니다.’와 함께 바람처럼 사라지는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돌이켜보면 같은 공간에 ‘단지 그냥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이 무겁지 않으나 묵직한 편안함으로 내 안에 남아있다. 어쩌면 그날 그 시간 좁은 사무실은 나에게 잠시 에덴이었는지도 모른다.
효율성이라든지 성과라 하는 것들이 없어도, 그저 시간 안에 함께 존재할 때, 우리는 에덴에 한 발 가까워질 수 있다. 언젠가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짙은 아쉬움이 깃든 시간보다 따듯하고 묵직한 에덴의 시간이 더 많이 켜켜이 쌓여 있기를. 그리고 그 시간들로 하여금 당신과 나 우리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청지기라는 이름으로 영원의 시간에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