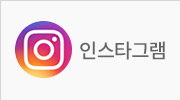[New-매거진D]
나는 공동체가 어렵다
관련링크
본문
IVF:D 뉴스레터 세 번째 이야기 - 나에게 공동체란?
나는 공동체가 어렵다
이상혁 간사 경기남지방회
코로나와 함께 하는 삶은 어느덧 1년 반째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이 바뀌었다. IVF도 예외는 아니었다. 엘지엠(큰모임), 소그룹, 디피엠, 심지어 수련회까지 IVF의 모임들은 모두 온라인으로 편입되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줌(ZOOM)이었지만 이제는 모두들 제법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언젠가 한 학생이 했던 말이 기억에 남는다. 온라인으로 계속 만나고는 있지만 관계가 여전히 고프다고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어떤 마음인지 알 것만 같았다. 코로나 이전에는 IVF 모임을 마치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수다 시간이었다. 엘지엠이 끝나도 강의실에서 다들 헤어질 줄을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다. 모임을 마치고 줌 회의 종료 버튼을 누르면, 숨어있던 정적과 고독이 금세 다시 고개를 든다. 방금까지 눈앞에 있던 사람들은 온데간데없고 그렇게 모두는 순간 외딴섬이 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 대다수가 백신을 접종하고 나면 코로나도 곧 종식될 거라고 기대했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보다 앞서 백신을 접종한 다른 나라들의 소식을 접하면서 이러한 기대가 너무 순진했음이 드러났다. 이제는 알파, 베타, 감마에 이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 우세종으로 등장했다. 생각하면 그 다음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다. 코로나에 완전한 종식은 없고, 우리의 삶도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 왜인지 우울한 기분이 들었다. 지난 시간 마스크 없는 삶을 기대했고,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모임을 바라왔다. 물론 때에 따라 줌이 더 편하게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오프라인 모임이 주된 모임일 때의 이야기이다. 코로나로 인해 찾아온 “뉴 노멀”을 받아들이기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되었다.
2000년대 후반에 대학에 입학했다. 그 때는 놀랍게도(!)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다. 당연히 카카오톡도 없었다. 당시 우리 공동체에는 동아리방이 없었는데 공동체방(IVF 구성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살던 자취방)이나 학교 도서관이 동아리방 역할을 대신했었다. 공강시간이면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이 공동체방이나 도서관에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그때가 점심이나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었고, 그게 아니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험 기간에는 공부를 하다 출출한 배를 달래려 같이 치킨을 뜯기도 했다. 치킨도 맛있었지만 함께 나누는 대화는 더 맛있었다. 그렇게 일상을 함께하는 시간들이 쌓여 자연스레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바탕으로 서로에 대한 사랑의 개입이 일어났다. 돌아보면 그 개입이 지나칠 때도, 또 실수일 때도 있었지만, 우리는 분명 서로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코로나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불만족스러웠던 것 중의 하나는, 우리가 일상을 공유하는 공간이 좁아지고 그 시간 역시 줄어들었다는 점이었다. 지난 시간의 경험은 지금의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게 했다. 이 시기를 잘 버티고 나면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때가 올 거라고 기대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순간은 오지 않을 것을 안다. 기대했던 제자리는 과거에 존재할 뿐, 현실에서는 이미 새로운 제자리가 자리를 잡았다. 사람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자연스럽게 넘나들며 만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물리적 공간 속의 나 못지않게 가상공간 속의 나 역시 더욱 중요해졌다. 코로나 이후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하는 방식에도 이미 한차례 큰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한 편, 이런 생각을 하면 불안한 것은 나의 마음이었다.
경험이 이상이 될 때, 그에 반하는 현실은 수정되거나 극복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전락한다. 과거 IVF에서의 시간이 좋았던 만큼,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은 불만족스러웠다. 시간이 지날수록 코로나 이전의 공동체 경험이 코로나 이후의 공동체 경험을 쉽게 평가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함께 잉여로운 시간을 보낼 수 없다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서로에 대한 관심도, 사랑의 개입도 없어지고 나면, 우리 공동체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 불안했다. 물론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여전히 관심을 가지며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애쓰는 것을 이따금씩 목격할 때도 있다. 때로 그 방식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 참신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의 공동체에 대한 근본적인 염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누군가는 지금의 변화가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언젠가 찾아올 변화였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다만 그 시기가 조금 앞당겨졌을 뿐이라고 하면서. 하지만 코로나 이전의 공동체 경험이 지배적인 나는, 지금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압축적인 변화가 소화하기 힘들다.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변화하는 현실을 따라 공동체 모임을 꾸려가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문득 문득 코로나 이전에 공동체로 함께 했던 순간들이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아무래도 가장 그리운 것은 공동체방에서, 또 학교 도서관 로비에서 삼삼오오 모여 함께 보냈던 잉여로운 시간들이다. 가상공간보다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만나는 것을 더 선호하고, 공식적인 모임을 마치고 시작되는 한없는 수다와 그렇게 낭비되는 시간들의 힘을 믿는 나는, 그래서 지금의 공동체가 어렵다. 아마도 당분간은 계속 헤맬 것 같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